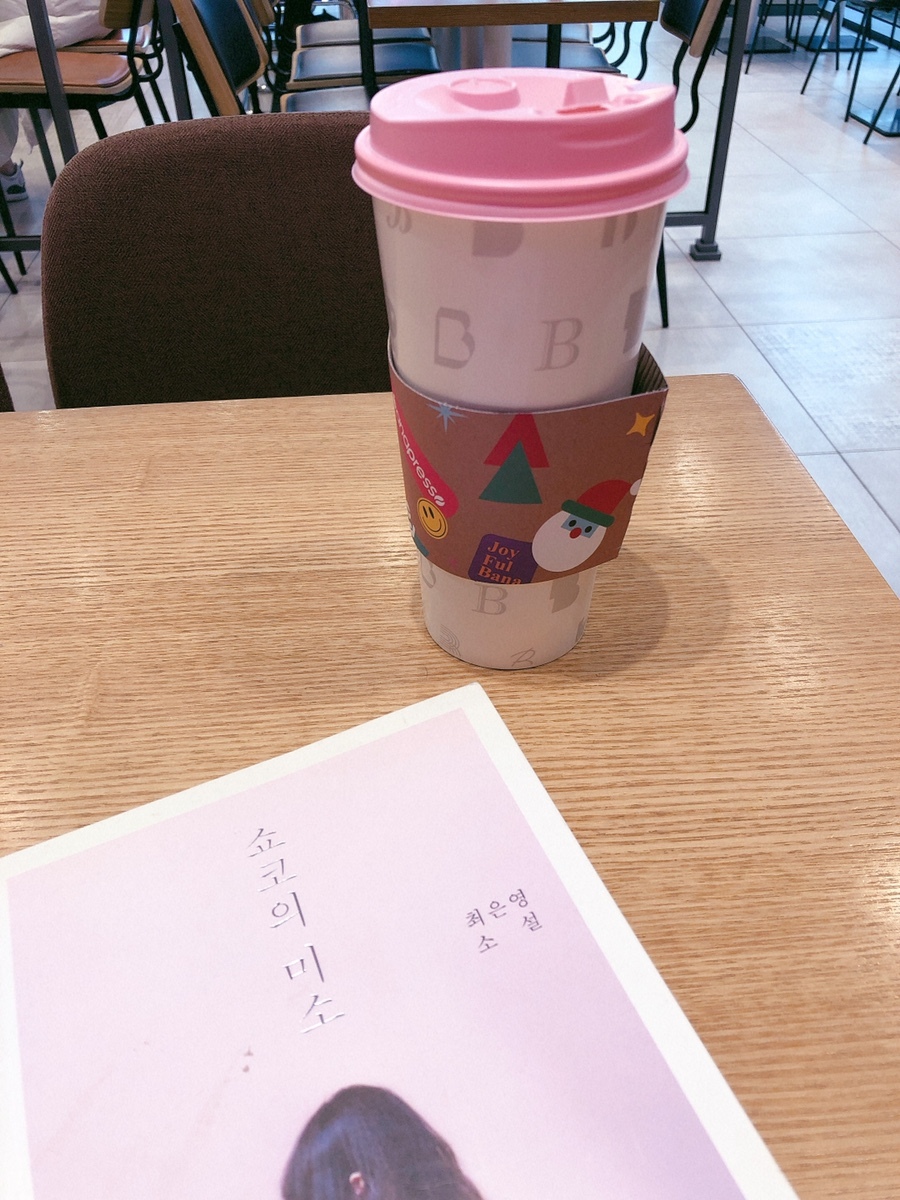
자전적인 작품이라 해서 쇼코의 미소를 떠올렸다. 시간이 남는 동안 카페에 앉아 다시 이 책을 펼쳤다. 작년을 결산하며 스물 한두살 쯤 최은영 작가님 북토크에 간 줄 알았는데 사인된 날짜를 보니 2018년이었다. 왠지 웃겼다. 2018년이나 새내기 때나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옛날인가 싶어서.
"나는 차가운 모래 속에 두 손을 넣고 검게 빛나는 바다를 바라본다."
첫 문장부터 이유 없이 너무 좋았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어딘지 조금은 께름칙한 기분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금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던 것도. 이렇게까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이 다 내 이야기 같아졌을까. 작가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했지만 자전적인 이야기가 보편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서 다가갈 수 있을 때 그걸 잘 만든 작품이라 부르는 것 같다. 학교 안이 정말로 세상의 전부이고 내 관계의 전부였던 때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은 내게 너무도 큰 의미였다.
"어떤 우정은 연애 같고, 어떤 연애는 우정 같다."
그리고 어떻게 내 얘기 같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닌 것 같은 마음으로 지내기를 반복하며 어떤 날은 죽을 것만큼 싫고 어떤 날은 적당히 견딜 만한 게 모여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이 싫어지기를 반복했었는데. 뱃머리를 돌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때마다 너무도 많았다. 그리고 원하는 것 ‘같은’ 일을 할 때도 결국 언제나 매끄럽게 달릴 순 없을 것이다. 순수한 열정 같은 마음 뿐만 아니라 우월감, 질투심, 열등감. 하나의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
이전엔 관계도 진로도 그렇게 느꼈지만 새롭게 비슷해진 게 있었다. 오히려 갑자기 병원에 가셨단 얘기를 들었을 땐 더 호들갑이었는데 너무 큰 소식이어선지 무덤덤했다. 그리고 나서는 알았다. 경험 했음에도 병에 서툴고 죽음에 서툴러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흐느끼고 싶을 만큼 울었고, 이야기에 맞는 언어를 입혀 만나게 해준 작가님께 감사하다.
'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 언어의 찬란함과 슬픔에 대하여 (0) | 2022.07.13 |
|---|---|
|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220109) (0) | 2022.07.13 |
| 여자에게는 야망이 필요하다: 자기 삶의 새로운 답을 찾은 여성들의 비밀 (0) | 2020.11.04 |
| 오늘부로 일년간 휴직합니다 (0) | 2020.10.25 |
| 정희진 -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 (0) | 2020.10.08 |



